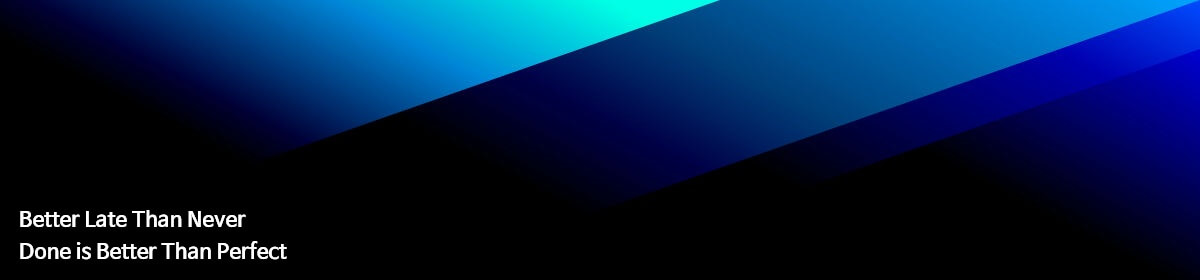병문안 다녀올 일이 있어서 1시간 정도 길게 버스를 탔다. 보통 이럴땐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듣고 싶어 저장해 놓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 날은 왠지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저 멍하니 차창밖을 바라 보며 하릴없이 보내고 싶었다. 승객들은 적당히 자리에 앉았고 서있는 승객은 아무도 없었다. 예전 버스는 출발이 더뎠는데 전기 버스는 승용차보다 더 날렵해졌다. 악셀을 밟으면 바로바로 반응하기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예전처럼 급출발 급정거했다가는 난리나겠단 생각을 잠깐 했다.
그 때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버스에 올라탔다. 빈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넓직한 장애인석 주변에 몰려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며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버스 속 소리를 독점했다. 조용하던 버스가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다. 기사분이 마이크로 학생들을 제지하며 위험하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니 아이들이 버스 제일 뒷자리로 약속한듯 우루루 몰려 갔다. 두 칸 앞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크기도 해서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대화를 그대로 엿듣게 됐다. 곧이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이 아이들의 조막만한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냥 욕설은 욕설이 아니었고 한 두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심한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

이어폰을 꼽아 욕설이 내 귀로 들어오는 걸 차단했더니 조금 있다가 초등학생들이 내리고 이번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아이 둘이 역시 그 뒷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어폰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려오는 말을 들으니 역시나 똑같았다. 한 단어 지나가면 욕이고 한 문장 사이 수 십번의 욕이 들어 있다. 그냥 욕설이 입에 붙어 있어 욕이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 놀라운 것은 잠깐 가족과 전화 통화할 때는 공손한 말투와 억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병문안 다녀오며 꼭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만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버스 안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정작 나도 환자인데 나만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