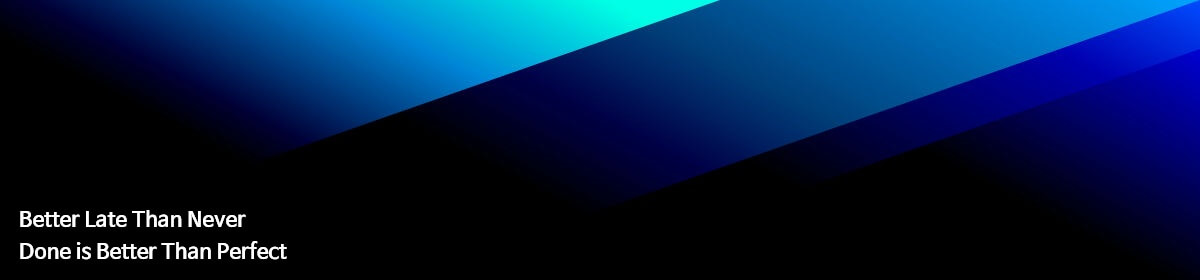여름 휴가의 시작을 “퍼펙트 데이즈”와 함께 했고 휴가의 끝을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와 함께 했다. 책은 아직 다 읽지 못했다. 요즘은 영상도 활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영화관에서 제대로 각잡고 영화를 본 지도 오래 됐고 휴가를 다녀온 지도 벌써 까마득하다. 예전같으면 바로바로 여행기고 독후감이고 영화감상문을 SNS에 올렸겠지만 이젠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그냥 느꼈으면 됐지 굳이 남겨야 하나…생각이 앞선다.

그래도 이 영화는 보고 나서도 잔상이 오래 남았기에 이렇게라도 흔적을 남긴다. ‘괴물’을 볼까 ‘퍼펙트 데이즈’를 볼까 아주 짧게 고민하다 이 영화를 골랐는데 지나보니 탁월한 선택이었다. 나중에 ‘괴물’을 챙겨 봤는데…생각보단 별로였다. 퍼펙트 데이즈는 생각보다 좋았고.
“다음은 다음, 지금은 지금”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도쿄 시내 화장실 청소부의 반복된 하루를 켜켜이 쌓아서 보여준다. 가족과도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둔 채, 자신의 하루를 꾹꾹 채워 평범하지만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간다. 적당한 거리감과 적당한 친밀감, 그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 내가 노년에 꿈꾸는 삶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고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행복을 볼 줄 아는 삶. 미래를 위해 미루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찰나에 깨어 있는 삶.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맥주 한 잔, 지인들과의 스몰 토크…블로그에 글 하나 남길 수 있는 여유 같은 것. 그러고 보니 블로그도 유튜브나 틱톡같은 숏폼에 밀려 이젠 옛스런 느낌마저 든다.
숏폼에 밀린 블로그처럼 핸드폰 같은 디지털카메라에 밀린 필름카메라나 음원에 밀린 카세트테이프 같은 옛 것들, 아날로그 감성이 영화 곳곳에 묻어나서도 재밌었지만 무엇보다 음악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음악도 귀에 익은 옛 것들이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책. 잠들기 전 영화 포스터처럼 머리맡에 놓인 작은 등을 켜고 주말마다 들르는 헌책방에서 산 책을 읽는다. 윌리엄 포크너 책(야생 종려나무)을 읽기에 나중에 검색도 해봤었다. 아마도 빔 벤더스 감독에게 영감을 준 책이라 생각했다.
헌 책방 주인은 주인공이 골라 든 책에 대해 이것저것 아는 체를 하며 덧붙인다. “같은 단어라도 이 작가가 사용하면 느낌이 완전 다르다”같은 방식으로. 주인공이 화장실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책방에 있는 모든 책을 읽고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에 그런 주인이 카운터를 지키고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헌 책방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