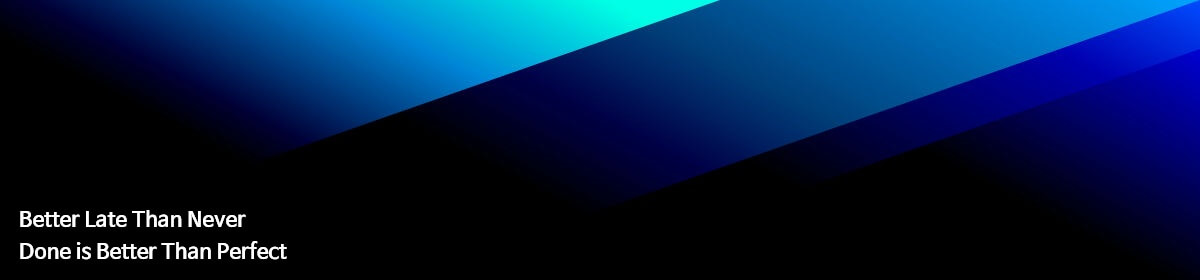지금은 후계자가 된 토드 콤스를 만난 찰리 멍거가 한 첫 질문은 이것이다. “What percentage of S&P 500 businesses would be a “better business” in five years.” 이 질문에 콤스는 5%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멍거는 2%미만이라고 말했다. 콤스는 500개 기업중에 25개 정도로 생각했고 멍거는 10개도 채 안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콤스가 버크셔에 합류해서 멍거와 버핏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향후 5년 동안의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 대략 7/1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대략 1/10 정도 예측이 맞았다고 한다. 세상의 본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좋은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성과지표가 있는지, 그리고 버크셔는 양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콤스는 일반적으로 매일 한 가지 질문을 지속적으로 묻는 방법과 비즈니스에서 해자가 더 넓은지 좁은지 여부를 설명했다. 버핏과 콤스가 기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의 98%는 정성적(품질)인 부분이다.
만일 한 기업의 계산한 PER가 30이라면 그것이 정당화 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 최악의 비즈니스는 성장하면서 수익은 감소하는 무한대의 자본이 필요하고(아쉽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최고의 비즈니스는 자본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버크셔는 보고된 이익이 아니라 owner’s earnings(FCF에 가깝다, 순이익+감가상각비-유무형자산투자-운전자본변동)에 집중한다. 보고된 이익과 owner’s earnings이 비슷하면 아주 좋은 사인이다.

콤스는 매주 토요일마다 버핏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지난 주에도 몇 시간동안 얘기를 나누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30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이것이다.
“How many names in the S&P are going to be 15x earnings in the next 12 months? How many are going to earn more in five years (using a 90% confidence interval), and how many will compound at 7% (using a 50% confidence interval)?”
당시 이 시험지를 활용한 대화에서 동일한 3~5개의 이름이 계속나왔기 때문에 애플을 찾는데 이 채점기준표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애플의 투자에 콤스가 어느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다른 후계자 테드 웨슬러가 아닐까 추측했었는데…과거 테드 웨슬러의 2016년 독일 잡지와의 인터뷰를 보면 아이폰의 높은 충성도와 애플 생태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처음에 내가 틀렸다고 적었었는데 아직 틀렸다고 단정짓기엔 이른것 같다. 둘 다 기여했을 수도 있고. 버핏도 이전에 그의 젊은 투자 대리인인 Todd Combs와 Tedd Weschler 중 “한 명 이상” 이 그 투자 배후에 있다고 암시했었고 구체적으로 밝히길 꺼려했다.
토드 콤스는 본인이 직접 버크셔에 전화해서 찰리 멍거와 만나게 됐고 테드 웨슬러는 버핏과의 점심식사를 2년 연속으로 낙찰되어 버핏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