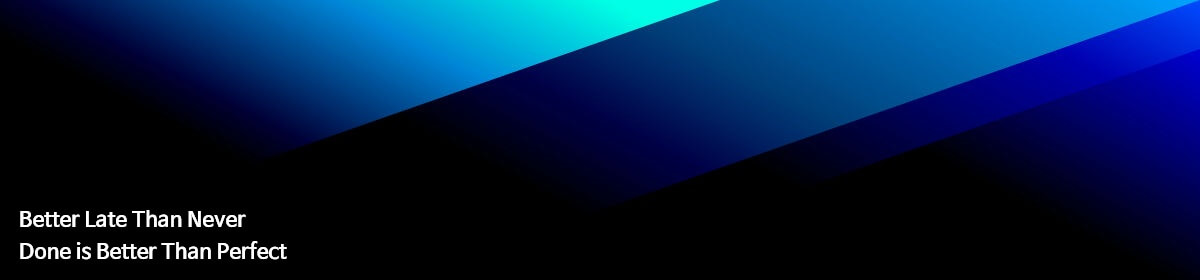핸드폰으로 달 사진을 찍어 봤다. 가끔 하늘을 쳐다 보는지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보름 즈음을 알게 된다. 슈퍼문이라고 했던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안하던 짓 하느라 손각대로 좀 흔들렸다. 이게 말로만 듣던 달고리즘인지도 모르겠다.

사진을 보면 새까맣게 달 주위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지만 그래도 난 구름이 달과 함께 있는 모습이 더 좋다. 이렇게 구름이 달을 가리기도 하고 또 달 빛이 구름을 빛나게도 하고.

이리 달 사진을 찍었지만 사실 요즘은 달보단 일출 사진 찍기 좋은 나날이다. 새벽마다 눈을 뜰 때면 예쁜 하늘보면서 습관처럼 한 장 씩 찍고 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도 결국 지나간다. 일출 직전 여명의 색이 좋은데 난 아침 역시 구름없이 깨끗한 하늘보다 이렇게 구름 낀 하늘이 더 좋다. 그럴때면 항상 삶도 그럴거란 생각을 한다.

결국 어둠과 구름은 걷히고 해는 뜬다. 모두에게 똑같이.
오늘 하루도 건강히~
“내 기척에 엄마가 돌아보고는 가만히 웃으며 내 빰을 손바닥으로 쓸었어. 뒷머리도, 어깨도, 등도 이어서 쓰다듬었어. 뻐근한 사랑이 살갗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처음으로 접은 부분이다. 곧이어 읽은 작가의 말.
“몇 년 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책을 덮으면서 이 책을 외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정말 힘들었겠단 생각을 했고, 오늘 기사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람의 인터뷰를 봤다. 프랑스어는 주어가 있어야 해서 주어 없이 ‘작별하지 않는다’가 성립하지 않아 ‘불가능한 작별’로 책 제목을 번역했다고 했다. 어디 제목뿐이랴.